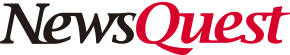삶의 질 중시 MZ 세대 지방 중소도시로 엑소더스
베이징의 오염극심과 상하이의 경제불황 못참아
![한때 젊은이의 거리로 불린 상하이 황푸구 신톈디. 요즘은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기 어렵다. 베이징의 대표적 젊은이의 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들의 엑소더스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제공=베이징칭녠바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7056_157240_462.jpg)
【뉴스퀘스트=베이징/전순기 통신원】 중국의 법적 행정 수도 베이징과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는 삶의 질이 대륙 최고는 아니라 해도 중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대도시들로 손꼽힌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MZ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이 현실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불후의 진리가 흔들거리고 있다. 중국 청년들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의 삶을 마다하고 다른 지방 도시들로 대대적, 경쟁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베이징과 상하이 엑소더스가 최근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진짜 그런지는 역시 이 도시들에 상주 중인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베이징이 그렇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베이징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직전인 5∼6년 전만 해도 외지에서 대학 진학 등이나 취업 등을 통해 진입에 성공한 영재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라고 단언해도 좋았다.
이들이 평균 4∼5년 동안 베이징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후커우(戶口. 호적) 획득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암시장에서 후커우가 최소한 50만 위안(元. 1억400만 원)에 거래되는 기가 막힌 케이스까지 있었던 사실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극단적으로 변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베이징 후커우가 여전히 상당히 인기이기는 하나 영재 청년들은 완전히 개 닭 보듯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과거 자신들에게도 하늘의 별이었다고 해도 좋을 후커우를 미련 없이 반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슈퍼 급 인재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진짜 희귀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역시 능력과 젊음을 다 가진 채 아쉬울 것 없는 직업도 보유한 인재들에게는 베이징이 살기 좋은 도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진짜 그런지는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미국의 주요 도시 못지않은 엄청난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세계 최악의 오염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인도 뉴델리보다 결코 낫다고 하기 어려운 끔찍한 대기의 질, 관료적인 업무 스타일과 느려 터진 일처리 속도 등 역시 원인으로 꼽혀야 한다.
이에 반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등의 도시들은 베이징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심지어 정 반대라고 해도 괜찮다. 당장 대기의 질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과는 정말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은 베이징보다 삶의 속도가 느긋하다. 여기에 더 개방적이면서 포용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삶의 질을 그 어느 것보다 중시하는 MZ세대 엘리트들이 굳이 베이징에 미련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도 광저우와 선전 등은 이들이 기를 쓰고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엘도라도가 되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드디어 꿈의 3만 달러에 올라선 몇 안 되는 대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에는 마도(魔都. 마귀의 도시)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까지 불리면서 청년들의 엑소더스를 대책 없이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상하이의 굴욕이라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다.
상하이가 언제 ‘꿈의 공장’으로 불렸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청년들의 탈주가 대유행 중이라는 사실은 젊은이들의 거리로 유명한 황푸(黃浦)구 신톈디(新天地) 등의 번화가가 최근 눈에 두드러지게 활력을 잃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마도라는 과도한 표현이 동원되는 것이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청년들의 엑소더스를 상하이의 뉴노멀로 만들어버린 결정적 원인은 누가 뭐래도 경제 불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인지는 역시 MZ세대의 실업률이 잘 말해준다. 전국 평균인 18% 전후보다 약 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취업 상태인 이들의 일자리 안정성도 상당히 낮다. 상하이의 주류 업종인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들의 평균 정년이 최소 35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상하이의 살인적인 물가까지 더할 경우 청년들이 상하이를 ‘꿈의 공장’이 아닌 마도로 불러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특히 부동산 산업에 잔뜩 낀 거품의 붕괴로 폭락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임대료나 집값 부담은 청년들의 절망을 더욱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허덕이게 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엑소더스를 결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청년들의 상하이 엑소더스는 외래 상주 인구의 폭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024년에 전년 대비 무려 2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대부분이 구직의 어려움 등에 절망한 청년들이라는 사실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당국 및 기업들은 젊은 인재 유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도 있다. 외지 출신들에 대한 보조금과 가족 수당 지급, 공무원 시험 데드라인 연령의 38세 연장 등이 이런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앞으로도 계속 마도로 불리면서 청년들의 엑소더스가 이제 불가역적인 현상으로 정착되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봐야 하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