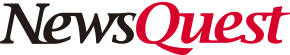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GPU)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6129_156267_4438.jpg)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삼성이 실제로 엔비디아(NVIDIA)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 서울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나란히 치맥과 소폭을 즐겼던 일은 그날 저녁에도 빠짐없이 안줏거리로 올랐다. 얼마 전까지도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납품을 시작한 소식도 빼놓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관료 출신 인사는 업계의 오랜 루머를 확인해줬다. 과거 2010년대 초중반 삼성이 엔비디아 인수를 검토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는 뒷 이야기였다.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인가. 역사상 시가총액 5조달러를 세계 최초로 넘긴 반도체 업계 1위 기업이다. 몸집은 구글의 알파벳과 메타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크고, 세계 3위 경제대국 독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5조100억달러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AI 반도체 시장에선 80%가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 지난 7월 말 기준 영업이익률은 66.4%. 쉽게 말해서 10만원어치를 팔면 6만원을 넘게 남기는 '현금 인출기' 수준의 기업이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었던 삼성이 실리콘밸리의 '신성'이던 엔비디아를 인수했다면, 그래서 AI 칩을 자체 설계·생산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삼성은 지금쯤 AI 반도체 생태계의 제왕이 되었을 지 모른다. 실제로 2012년 엔비디아의 주가는 주당 10달러에 불과했다.
시계를 되돌려 2016년으로 가보자. 2016년은 아주 뜨거운 해였다. 전세계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한 해였고,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며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해였고,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은 해였다. AI는 대국 내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잇달아 보여주며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이 엔비디아는 AI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암호화폐 채굴 열풍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판매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고속 AI 연산 부품인 텐서코어를 장착한 GPU ‘V100’을 출하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가 선정한 '2017년 가장 스마트한 기업' 1위에 올랐다.
그즈음이던 2016년 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려갔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인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전실(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몇 달이 지난 새해 2월 이 부회장은 구속됐고 '삼성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그룹 전체의 인수합병(M&A) 등 미래 신사업 발굴 업무를 총괄했던 미전실은 '적폐'로 몰려 해체됐다. 삼성전자는 조정·총괄 조직 사업지원TF를 신설해 삼성 비서실 재무팀 출신 정현호 당시 사장이 이끌게 됐다.
바로 다음해인 2018년 젠슨 황이 비밀리에 삼성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HBM 개발 확장과 파운드리 사업 협력 등을 제안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젠슨 황은 당시 검찰 조사와 법정 구속 등 사법리스크에 묶였던 이재용 회장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다.
문전박대를 당한 엔비디아는 ‘만년 2등’ 메모리기업 SK하이닉스에 접촉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2022년 HBM3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매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영업이익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다. 삼성이 오너 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바람에 반도체 업계의 역사가 뒤집한 것이다.
다시 치맥 회동 날로 돌아오자. 젠슨 황은 이 날 고(故)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들고 왔다. 이건희 회장은 1974년 선대 고 이병철 회장과 경영진의 만류에도 사재까지 털어 반도체 사업 진출을 단행하며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든 인물이다. 1996년 쓰인 편지엔 이 회장의 시간을 초월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엔비디아에 협력을 요구하는 사연이 담겨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해 듣는 이재용 회장의 심정은 꽤나 복잡했을 것 같다.
대부분의 세상일이 그렇듯 사업도 시나리오대로 되지만은 않는다. 당시라고 해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 인수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인수를 성사했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혁신은 삼성이라는 완벽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안에서 빛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대작가 마크 트웨인조차도 "나는 기회가 사라지기 전까지 기회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이 기회인지 위협인지는 미리 헤아리기 어렵지만, 사법 리스크를 털고 거액의 유보금을 쥔 이재용 회장은 다시 M&A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무심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와 산업계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