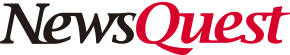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뉴스퀘스트=박형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한때 국내 통신사 대리점(판매점 포함)이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 때가 있었다.
도심지 및 지하철역 등 주요 상권마다 한집 건너 하나씩 점포마다 통신사 간판을 달고 문전성시 영업을 할 때다.
하지만 이제 통신 가입회선이 7000만을 넘어섰고 1인 1스마트폰은 기본인 지라 모두 지난 일이 되었다.
단통법은 제정될 때인 10년 전에도 시끄러웠다.
당시 과도한 차별적인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현안이었고, 일명 ‘호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법을 통과시겼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재원도 공시하는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고 통신사 공시지원금만 법안에 반영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 되었다.
본래 단통법의 제정 취지는 거창했다.
‘단통법’의 정식 법안명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촉진법’으로 법 제정 당시의 제안 내용을 보면 유심(USIM) 이동성을 촉진해서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더 높이는 정책이었다.
통신사업자간 자발적인 서비스·요금경쟁이 아니라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면 사업자간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는 규제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공시를 통한 단말기별 획일적인 지원금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약화시키고 사업자의 마케팅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공시를 통한 지원금은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이는 곧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하다는 단통법의 도입 목적과 애당초 맞지 않는 것이었다.
혹자는 정부가 시장의 마케팅과 경쟁을 법으로 규정하고 유도하는 것이 애당초 한계였다는 지적이다.
이제 과거의 논의를 건너뛰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용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해괴한 주장이 등장했다.
고가단말기 선호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다시 인위적으로 단통법을 폐지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사물통신인 IOT회선을 제외하면 5000만이 넘는 휴대폰을 국민들이 사용하고 고가 단말기 비중이 매년 판매되는 단말기의 80 %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도 이용자의 요금과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 요금제 선택방안이 제공 중이다.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물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제공하는 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하면 자신의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통신요금은 서민의 가계생활비에 부담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에대한 논의를 국회 등 정치권에서 주도하고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가입한 요금제가 얼마이고 데이터 등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는지는 관심밖이다.그저 요금과 휴대폰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있다
이번에도 10년전 요란하게 도입된 단통법이 정작 사업자간의 경쟁을 가로막아서 서민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만이 먹히고있다.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있는 완전자급제(통신사업자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를 분리해서 서비스 가입만 받는 방안)도 단통법 도입당시 논의를 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라서 시행이 안된 전력이 있다.
법만 만들면 시장이 저절로 따라 올거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단통법 폐지논의에 앞서 합리적인 통신소비와 국내에서는 고가 단말기만 팔리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점검할 시점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 해당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