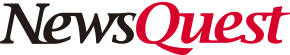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사진=픽사베이]](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0/232658_129754_4621.jpg)
【뉴스퀘스트=박형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무섭다.
디지털 경제의 코어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이제 ‘반독점’이라는 깃발아래 공공의 적이 된 듯하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독과점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제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초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에 부과한 130억유로(한화로 약19조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0/232658_129757_4730.jpg)
애플은 아일랜드에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매출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아일랜드 정부는 파격적인 세금혜택으로 보답했다.
통상 12%인 법인세를 5%이하 최저세율에 근접하게 부과하고, 애플은 손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은 이러한 세금감면을 사실상의 조세회피로 간주했다.
그리고 애플이 지난 20여년간 불법적인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보고, 130억유로를 환수하라고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이 공모해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일랜드 정부의 세금감면은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다른 애플 서비스를 보조해서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개별국가의 관련법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부를 판단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의 모바일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구글은 스마트폰 두뇌인 운영체제(OS)와 모바일 광고시장에서 모두 독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중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모바일 광고시장도 그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따라서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그 영향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는 부지기수다.
특히 신생 인터넷 서비스는 구글에 생명줄을 맡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유럽재판소(ECJ)는 지난 2017년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 광고를 우선 노출한 ‘반독점’행위 위반에 대해 과징금 24억유로를 최종확정했다.
선수가 심판을 겸업해서 알고리즘을 자사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참여자간의 중개기반을 만들고 서로 윈-윈한다는 플랫폼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이다.
![[사진=픽사베이]](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0/232658_129755_4654.jpg)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의 반독점 행태는 해외사례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애플과 구글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공백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국내 진출시부터 자사 신제품 광고비를 모두 국내 통신사에 떠넘기고 있다.
연간 200억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 갑질 행위의 전형이다. 글로벌 경쟁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전액 자기비용으로 광고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2018년 공정위가 조사 끝에 1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상생방안을 제출하고 과징금 처분을 피했다.
하지만 동의의결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제출한 상생방안은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국내에 애플 R&D센터 건립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통신사와 문제가 되는 계약내용만 재빨리 변경했다고 한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1년여간 조사하고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가 가능한 시정조치안까지 검토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은 거래와 중계를 함께 하는 인프라로서 ‘선한 의지’로 시작했다. 초기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도서관과 백과사전의 지식을 공유의 장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논문처럼 정확도가 높아 유용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이제 ‘사악한 독점’의 괴물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플랫폼의 독점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과 경쟁자를 배제하려고 기를 쓴다
이제 글로벌 플랫폼의 ‘사악한 독점’에 균형 있는 규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유독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만 엄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혹 규제의 편의성과 국내사업자라서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큰 역차별이다.
독자 플랫폼이 없는 유럽 및 일본과 다르게 국내 플랫폼은 코로나19때 공공앱으로 방역에 톡톡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규제 공백인 글로벌 플랫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규제과잉인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 해당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