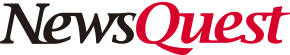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오후 대전 서구 서대전고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6597_156779_5114.jpg)
【뉴스퀘스트=정태성 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다양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수능이 어려웠다는 기사, 제도 개편을 다룬 기사, 수능이 끝나자마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조명한 기사 등 어찌 보면 해마다 주제는 비슷하고 내용만 바뀌는 듯한 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유난히 한 기사 한 기사를 꼼꼼히 챙겨보게 됐다. 고3 수험생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학입시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때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큰아이가 입시를 앞두자 다시 관심이 되살아났다.
아마 둘째와 셋째가 입시를 준비할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입시 제도나 그 부조리에 대한 관심은 또 금세 멀어질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 문제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본성상, 당장 눈앞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사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유명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그는 본래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도덕철학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철학을 전공했고,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부론>을 내기 17년 전인 1759년에는 또 하나의 명저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발표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깊이를 지녔지만, 기본 전제는 ‘인간은 타인에게 동감(同感)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도덕감정론>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보일 때가 있지만,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게 하는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해석문에서 발췌)
이후 스미스는, 인간은 공감 능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자신의 작은 고통을 남의 큰 불행보다 더 깊이 느끼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 예로, 그는 유럽의 한 휴머니스트가 먼 중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인들의 불운을 애도하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위태로운지를 생각하며 잠시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내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면, 아마도 그 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반면 수억 명이 희생된 그 지진에 대해서는 적절히 애도를 표한 뒤 곧 평온히 잠들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적 인간’을 주장한 경제학자가 바로 이 애덤 스미스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누구보다도 깊은 통찰을 지닌 철학자였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도덕감정론>을 계속 수정할 만큼 이 책에 큰 애정을 쏟았다.
아마도 스미스에게 경제학은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학문이었다. 경제는 인간의 심리 위에서 작동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의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과 맞닿아 있다.
비록 행동경제학은 1979년 대니얼 카너먼의 논문에서 학문적으로 출발했다고 알려졌지만, 미국 대학의 몇몇 교재에서는 애덤 스미스를 ‘최초의 행동경제학자’로 소개하기도 한다.
행동경제학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손해가,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되며, 같은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점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즉, 모든 사람의 기쁨과 슬픔은 절대적이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능을 치른 모든 학생들은 이제 제도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애덤 스미스처럼 각자의 인생의 주체로서 ‘행복은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성찰해보길 바란다.
※ 필자소개 : 정태성 한국행동경제연구소 대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전략, 마케팅과 스포츠 마케팅, 공공부문의 정책입안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컨설팅 결과가 인간의 심리나 행동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던 중, 행동경제학자인 서울대 최승주교수와 빅데이터분석 권위자인 한양대 강형구 교수와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정부와 기업 대상 행동경제학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강연 및 행동경제학 관련 칼럼과 영상을 통해 행동경제학을 보다 알기 쉽게 전파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