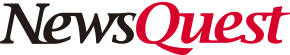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일러스트=챗GPT]](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6845_157024_735.png)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최근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0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 유예나 직무·산업별 단계적 상향, 고령 인력 재교육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정년 연장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력 활용과 임금 구조 개선을 병행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장면이 있다.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논의가 곧바로 ‘세대 갈등’으로 비약된다는 점이다. 기성세대는 일자리를 지키려 하고, 청년층은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빠르게 만들어진다. 여기에 재계는 고령 인력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조하고, 일부 노조는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앞세우며 갈등 구조를 덧씌운다.
하지만 실제 여론을 들여다보면 이런 프레임은 현실과 상당한 간극이 있다. 리멤버앤컴퍼니가 1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직장인의 70% 안팎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청년층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세대별 우선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노후 불안과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등 구조적 위험이 세대 전반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39%가 ‘노후 생활 안정’을, 17.8%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꼽았다. 청년층 역시 안정적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 속에 있으며, 이 점에서 기성세대와 동일한 이유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필요한 선결 과제를 묻는 항목에서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20대는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고, 40~50대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와 재교육 강화를 먼저 꼽았다. 다만,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정년 연장이 단독으로 이뤄져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인사·임금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세대 간 충돌이 아니라 낡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논의가 본격화될 때마다 세대 대립 구도가 앞세워지고,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 과제다. 연공 중심 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무 중심 인사체계와 재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 역시 이러한 다층적 개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 간 반목의 장면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직장인 다수가 이미 정년 연장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제도 개선의 본질적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