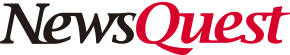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에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 투자
투자 대비 수익 성과는 글쎄...AI 서비스 유료 이용 익숙치 않아
최근 유료 모델로 사용량 기반 과금, 기능별 차등 가격제 논의
![생성형 AI 개발에 앞장서왔던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료 서비스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MIT]](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9496_125830_2010.jpg)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수익 창출화를 놓고 기업들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비롯해 수천억원의 반도체 칩을 사들여가며 마련한 AI 인프라와 LLM(대형언어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도 확연한 수익 성과가 드러나고지 않아서다.
여기에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안정적인 수익 확보 없이는 생성형 AI가 기업들에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도입 중인 유료 수익화 모델 역시 아직까진 난제다.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들에겐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고, '환각 현상' 해결도 쉽지 않아 유료 고객들의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픈AI가 챗GPT를 만들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 1만개 이상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9496_125831_2023.jpg)
16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개발에 앞장서왔던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료 서비스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조단위가 넘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인 수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일반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컴퓨팅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법률 및 윤리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드는 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천억원대에서 많게는 조단위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팅 인프라의 경우,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규모로 구축해야 하는데 오픈AI나 메타, 테슬라 등의 기업은 이를 위해 1만개 이상의 GPU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GPU 칩 한 개 가격이 1000만원대를 넘는 만큼 컴퓨팅 인프라 구축만 해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픈AI의 창시자인 '샘 올트만'은 지난 3월 출시한 자사의 생성형 AI인 '지피티-4'에 엔비디아 칩이 1만개 사용됐다며 이를 훈련하기 위해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픈AI의 창시자인 '샘 올트만'은 지난 3월 출시한 자사의 생성형 AI인 '지피티-4'에 엔비디아 칩이 1만개 사용됐다며 이를 훈련하기 위해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9496_125835_2217.jpg)
이처럼 수천억원대의 투자 대비 생성형 AI의 수익화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오히려 포털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구글의 경우 생성형 AI가 광고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이 포털 검색시 제공되는 뉴스나 광고 사이트를 통해 창출되는데, 생성형 AI 검색에선 사이트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무료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들도 점차 유료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오픈AI와 구글은 각각 지난해 2월과 올 2월에 월 20달러(약 2만7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 버전을 출시했다.
이용자 수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오픈AI의 GPT의 유료 이용자는 이들 기업의 AI 목표 매출액을 추산했을 때 오픈AI의 경우 지난해 최소 200만명 이상이 유료 버전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구글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선 사실상 오픈A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AI 개발 업체들이 투자 대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AI 개발자 A씨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선 현재까지의 생성형 AI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씨는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천억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서 인간과 같은 추론을 해내는 것"이라며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자원에 비해서 아직까지 극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이 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특히나 생성형 AI 연구 개발이 비용 문제로 인해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는 "현재 수백개의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이 수익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며 "결국에는 투자 대비 수익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픈AI나 구글과 같은 대형 서비스 기업 몇몇과 특색 있는 업체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픈AI의 GPT의 유료 이용자는 이들 기업의 AI 목표 매출액을 추산했을 때 오픈AI의 경우 지난해 최소 200만명 이상이 유료 버전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9496_125833_2136.jpeg)
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무용론에 대해서는 반박의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2살 정도 된 아이에게 곧장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기술 자체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자원 확보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AI 개발자 B씨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화 모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월정액 기반 모델과 함께 사용량 기반 과금이나 기능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세분화된 수익화 모델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연구 개발 자체도 대규모가 아닌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sLLM(소형언어모델) 등이 도입되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비용 대비 수익화 문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