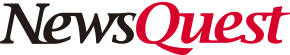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4254명 조사 ‘한국인 노화불안 척도’ 개발
한국인 평균 노화불안 지수 3.23점...청년층이 중년·노년층 보다 높아
![[자료=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9/252897_152816_2731.png)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우리 국민들의 노화에 대한 불안 수준은 평균 3.23점(5점 만점)으로, 특히 건강 악화와 경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홀로 살거나 미혼, 무자녀 국민들의 불안이 훨씬 더 높았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은 2024년 전국 성인 남녀 42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해 ‘한국인 노화불안 척도’를 개발해 이 같은 결과를 분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9개 불안 요인 가운데 ‘건강 상태 악화’ 불안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력 상실’(3.57점), ‘이동성 저하’(3.36점), ‘죽음과 상실감’(3.21점), ‘외모 변화’(3.16점), ‘노인 낙인 인식’(3.13점), ‘사회적 소외’(3.08점) 순이었다. ‘취미·여가 활동 결핍’(2.89점)과 ‘관계적 빈곤’(2.84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20~30대)의 평균 불안 수준이 3.38점으로 중년층(40~50대 3.19점), 고령층(60대 이상 3.12점)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은 사회적 소외와 노인 낙인 인식 불안에서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최근 심화된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 현상이 청년 세대의 미래 자아상에 투영되면서 노화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8점으로 남성(3.17점)보다 높았다. 미혼자(3.33점)는 기혼자(3.17점)보다, 독거 가구(3.31점)는 비독거 가구(3.21점)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의 경우 사회적 소외와 낙인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적 조건도 노화불안을 가르는 주요 변수였다. 임금근로자는 3.26점으로 비임금근로자(3.13점)보다 불안이 컸다. 정년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점이 뚜렷한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의 불안 수준은 각각 3.30점, 3.26점으로, 중·고소득층(3.15~3.18점)보다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전·월세 거주자(3.35점)가 자가·무상 거주자(3.17점)보다 불안이 컸다.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공적연금 가입 여부가 불안을 가르는 경계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비가입자의 불안 수준은 3.32점으로, 국민연금(3.19점)이나 직역연금(3.16점) 가입자보다 높았다. 특히 직역연금 가입자가 가장 낮은 불안을 보인 것은 제도별 보장성 차이가 노후 불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고령층만 따로 보면 농촌 지역 거주자의 불안은 3.39점으로, 도시 거주자(3.08점)보다 높았다. 의료 접근성 한계, 사회참여 기회 부족, 사회관계망 축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노화불안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요인과 직결돼 있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무주택 고령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지역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의 불안 역전 현상은 노후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경고로 읽을 수 있다”며 “정책과 개인의 대비가 병행될 때만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