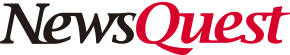지난해 양사 인도 법인, 매출·순이익 두 자릿수 증가
가전·스마트폰 판매 정체 속 인도 시장 가파른 성장 '주목'
14억 인구 기반 풍부한 내수와 현지 생산 구조로 사업 기회 커
"관세 부과, 중국 규제 등 트럼프 2기 리스크 우려도 덜 해"
![삼성전자서비스 '갤럭시 서비스 전문 강사'가 인도 델리 서비스센터와 뭄바이 CS 아카데미에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518_139042_3253.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그간 가전제품에선 양 사 모두 북미, 유럽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인도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양사가 인도에 주목하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관세 부과, 중국 규제 등 리스크가 커진 탓도 있다.
인도는 미국의 반중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리스크에서 비교적 안전한데다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에서의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생산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인도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가전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북미, 유럽 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된 반면 인도 시장만큼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양 사의 인도법인 매출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매출 17조489억원을 기록해 2023년(15조2163억원)보다 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조1532억원에서 1조4083억원으로 22% 가량 늘었다.
삼성전자의 인도 매출규모는 아직은 미국(약 40조원)에 비해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미국 시장이 지난해 39조원에서 40조로 1조원 가량 매출규모를 확대하는데 그친 반면 인도법인은 같은 기간 2조원 가량 매출 규모를 키웠다는 점에서 성장속도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인도에서의 실적을 견인하는 제품은 삼성TV와 스마트폰 갤럭시다. 삼성TV는 2017년부터 현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역시 2023년 기준 출하량 기준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스마트폰이 중국기업에 1,2위를 내주면서 경쟁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내 인도 IPO(기업공개)를 추진중인 LG전자 역시 인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해 3조79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23년(3조3009억원)과 비교해 14.8% 가량 규모를 키웠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3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3.4% 증가하는 등 수익성도 높아졌다.
인도 시장은 LG전자가 연초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전망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유일하게 상반기·하반기 모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점찍은 곳이기도 하다. 14억명이 넘는 인구와 함께 소비력 높은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며 성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에 비해 인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군이 냉장고·세탁기·TV 등 가전으로 좁다보니 매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인도법인 매출 규모로 따지면 아직은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비해 5배 가량 앞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구개발(R&D)과 생산까지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지완결형 사업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도 인도를 눈여겨 보고 있다. 현지의 IT 인력과 젊은 노동력을 통해 연구개발 뿐 아니라 생산까지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인도 벵갈루루에 LG 소프트 인디아를 글로벌 R&D허브로 구축해 AI(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가전, 전장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푸네 공장과 노이다 공장 등에서는 냉장고·세탁기·TV 등 가전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인도에 R&D센터와 디자인센터를 운영중이며 델리 인근 노이다 공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첸나이 인근 칸치푸람 공장에서는 냉장고·세탁기·TV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 중국 규제 등의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곳이라는 장점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이 인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인도 진출 한국기업 입장에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 제재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인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부분 내수 시장을 노리거나 향후의 생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2기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