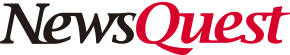![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325_138812_1832.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삼성전자가 최근 개편한 이사회 구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핵심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위상에 맞는 선진적인 면모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TSMC 와의 이사회 구성과 비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TSMC의 이사회를 살펴보면 사외이사 7명 중 6명은 미국, 영국, 베네수엘라 등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삼성전자 이사회 멤버는 여전히 100% 한국인으로 채워져 국적 다양성 면에서 아직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표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국적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사회 후보를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도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 다양성을 고려해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사외이사로 외국인을 영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의 약 90%를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또 주식의 절반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사회 구성 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와도 비교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담당인 호세 무노스 대표이사 사장이 첫 외국인 CEO이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에는 현대차 최초로 싱가포르 국적인 벤자민 탄 전 싱가포르투자청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오너경영,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비슷한 위치지만 이사회 구성에선 현대차가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긴 했다. 금융과 재무, 정부관료에 치중된 이사회에서 반도체 전문가 3명을 신임 사내외이사 후보로 내정했기 때문이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게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재무·회계, 리스크 관리, 리더십, 보드(Board) 경험, 글로벌 비즈·국제관계,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법률·행정·공공정책, M&A(인수합병)·투자, 산업&테크 등 모든 항목에서 두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까다로운 요건을 뚫고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가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대학교수보다는 전직 글로벌 반도체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다시 TSMC 이사회로 눈을 돌려보자. TSMC는 사외이사 7명 중 4명이 외국인인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와 장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스플린터는 인텔 부사장과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모셰 가브리엘로프 사외이사는 AMD에 인수된 자일링스의 전 CEO이며, 피터 리히 본필드 전 NXP 반도체 회장 역시 업계 전문가다. 학계 인물이지만 레오 라파엘 레이프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전 총장 역시 반도체 전문가에 속한다.
특히 레이프 전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계 유학생들을 억압하는 미 정부에 대항해 기술 연구에 국경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삼성전자가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적과 상관없이 이공계의 우수 인재를 확보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변화는 그간 삼성전자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내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외국인 인재영입에 걸맞게 외국인 사외이사 영입 문턱도 더 낮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